문화산책
View Article
뫼르소와 프레디: 시간이란 무엇인가
뫼르소.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그가 배심원들로 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방인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십여 년 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있었던 떠들썩했던 재판 - O. J. Simpson이 자기 부인을 죽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그를 체포한 백인 경찰들이 무전기를 통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적 경찰들의 증언을 배심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으로써 무죄 평결을 받은 -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미식축구의 영웅이었던 Simpson 사건이 신속하게 결판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재판의 주심이었던 일본계 사토 판사의 개인적 이력이나, 그가 사용하던 도시바 Satellite 랩탑 컴퓨터 등에 대해서조차 시시콜콜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건을 대상화, 상품화시켜 버렸다. 이방인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카뮈의 표현을 빌자면 ‘부조리한’) 장면은, 정작 뫼르소의 재판이다. 그는 자신의 살인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검사와 판사가 집요하게 추궁하던 "어머니 장례 기간 중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변명하려는 태도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뫼르소에겐 그 두 사건이 전혀 별개였으며, 자신과 그 사건들 사이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가 두려워 한 것은 단 하나였다: 죽음.
뫼르소가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것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 뿐 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가 죽음으로써만 확정된다.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다. 마치 사형장면을 구경하고 돌아온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듯이.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음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는 삶도 의미가 없다. 그는 감옥에서 이불을 턱밑으로 바짝 끌어당겨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두려워한다. 두려움으로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뫼르소는 죽음 직전까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Freud는 모든 인간은 생의 욕망과 함께 죽음의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에 의하면 생의 목적(destination)은 죽음이다. 죽음을 위해서 산다니, 이처럼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뫼르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다. 뫼르소를 회심시키기 위해 방문한 신부에게 뫼르소는 이렇게 외친다.
“너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뫼르소가 죽음의 운명 - 그 만의 운명이 아닌 모든 사람의 운명으로서의 운명 - 을 넘어서서 죽는 순간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은 운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 카뮈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실존적 인간의 모습이다. 영원히 재귀하는 일상 속에 기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제약은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나, 생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시지프는 지나간 시간으로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억과 예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마치 하루하루를 낯설게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조르바와 같다.
뫼르소에게 있어서 시간의 구속에 대한 자각은 강렬한 태양빛으로 다가온다. 땀이 흘러 시야를 가리고, 사방을 환하게 만들어 일상을 극도의 권태 속으로 밀치는 태양빛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바로 그 권태를 바탕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의 단절은 기계적인 일상과의 단절이며,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실존의 개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다.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무한한 생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프레디.
그가 어떻게 일차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레디의 참전 개연성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세상은 주어진 조건인 것 처럼, 전쟁은 프레디에게 주어진 조건인 것이다. 그는 전쟁에 아무런 의욕과 동기를 갖지 못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로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뿐이었다. 물론, 전쟁의 의미에 대해 동료들과 격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은 전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적어도 참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겐, 이기거나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참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겐 아예 존재하지 조차 않는다. 전쟁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참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없는 살인과 부상, 죽음만이 있다. 영화 Deer Hunter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 작은 도시에 살던 껄렁패들에게 월남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유와 명분도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살육전에서 제 정신을 갖고 살아 돌아온다는 건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수용소에서 강요되던 러시안 룰렛에 빠져 반 미치광이, 스스로 작은 戰爭狂이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프레디에게 있어 전쟁은 그의 일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의 조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랑을 찾는다. 군인으로서의 정체 조차도 모호했던 프레디에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캐서린을 사랑한다는 것 뿐이다. 부상당한 다리로 군무이탈자를 검문하던 헌병으로부터 도망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순간에도 프레디의 머리엔 별다른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캐서린에 대한 생각뿐이다. 도무지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캐서린이라는 여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다.
전쟁으로부터 그는 벗어났다. 마치 컴컴한 어둠을 가로질러 호숫가 저편의 스위스로 탈출하듯이. 그는 삶의 어둠을 벗어난 것이다. 삶의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다소 뻔뻔스런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서머셋 모옴의 달과 육펜스의 스트릭랜드처럼,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조건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캐서린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도 결국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캐서린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지만, 그녀는 죽고 만다. 캐서린의 죽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는 그 현실을 직시한다.
프레디에게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시간의 속박으로 부터의 탈출에서 비롯된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프레디의 인식은 종종 비를 통해서, 혹은 비를 뚫고 나타난다. 존재와 현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서의 비. 프레디는 비를 뚫고 현실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비를 맞으며 현실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기도 한다. 차가운 강물 속을 빠른 속도로 떠내려 가면서 전쟁의 현실을 벗어나기도 하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어두운 호수를 건너 전쟁을 떠난다. 의미없는 어둠의 현실을 살게 했던 유일한 존재였던 캐서린의 죽음 조차 받아들이고 그 전날 묵었던 호텔로 걸어서 돌아가는 프레디의 머리위에도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다.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준엄하게 응시하며 걸어가는 시지프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볕처럼.
우리는 한계 속에 살다 무한 속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는 무한을 누리다 한계 속에 죽을 것이다
- 수평선, 최승호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그가 배심원들로 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방인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십여 년 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있었던 떠들썩했던 재판 - O. J. Simpson이 자기 부인을 죽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그를 체포한 백인 경찰들이 무전기를 통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적 경찰들의 증언을 배심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으로써 무죄 평결을 받은 -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미식축구의 영웅이었던 Simpson 사건이 신속하게 결판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재판의 주심이었던 일본계 사토 판사의 개인적 이력이나, 그가 사용하던 도시바 Satellite 랩탑 컴퓨터 등에 대해서조차 시시콜콜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건을 대상화, 상품화시켜 버렸다. 이방인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카뮈의 표현을 빌자면 ‘부조리한’) 장면은, 정작 뫼르소의 재판이다. 그는 자신의 살인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검사와 판사가 집요하게 추궁하던 "어머니 장례 기간 중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변명하려는 태도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뫼르소에겐 그 두 사건이 전혀 별개였으며, 자신과 그 사건들 사이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가 두려워 한 것은 단 하나였다: 죽음.
뫼르소가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것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 뿐 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가 죽음으로써만 확정된다.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다. 마치 사형장면을 구경하고 돌아온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듯이.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음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는 삶도 의미가 없다. 그는 감옥에서 이불을 턱밑으로 바짝 끌어당겨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두려워한다. 두려움으로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뫼르소는 죽음 직전까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Freud는 모든 인간은 생의 욕망과 함께 죽음의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에 의하면 생의 목적(destination)은 죽음이다. 죽음을 위해서 산다니, 이처럼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뫼르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다. 뫼르소를 회심시키기 위해 방문한 신부에게 뫼르소는 이렇게 외친다.
“너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뫼르소가 죽음의 운명 - 그 만의 운명이 아닌 모든 사람의 운명으로서의 운명 - 을 넘어서서 죽는 순간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은 운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 카뮈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실존적 인간의 모습이다. 영원히 재귀하는 일상 속에 기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제약은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나, 생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시지프는 지나간 시간으로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억과 예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마치 하루하루를 낯설게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조르바와 같다.
뫼르소에게 있어서 시간의 구속에 대한 자각은 강렬한 태양빛으로 다가온다. 땀이 흘러 시야를 가리고, 사방을 환하게 만들어 일상을 극도의 권태 속으로 밀치는 태양빛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바로 그 권태를 바탕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의 단절은 기계적인 일상과의 단절이며,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실존의 개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다.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무한한 생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프레디.
그가 어떻게 일차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레디의 참전 개연성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세상은 주어진 조건인 것 처럼, 전쟁은 프레디에게 주어진 조건인 것이다. 그는 전쟁에 아무런 의욕과 동기를 갖지 못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로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뿐이었다. 물론, 전쟁의 의미에 대해 동료들과 격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은 전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적어도 참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겐, 이기거나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참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겐 아예 존재하지 조차 않는다. 전쟁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참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없는 살인과 부상, 죽음만이 있다. 영화 Deer Hunter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 작은 도시에 살던 껄렁패들에게 월남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유와 명분도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살육전에서 제 정신을 갖고 살아 돌아온다는 건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수용소에서 강요되던 러시안 룰렛에 빠져 반 미치광이, 스스로 작은 戰爭狂이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프레디에게 있어 전쟁은 그의 일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의 조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랑을 찾는다. 군인으로서의 정체 조차도 모호했던 프레디에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캐서린을 사랑한다는 것 뿐이다. 부상당한 다리로 군무이탈자를 검문하던 헌병으로부터 도망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순간에도 프레디의 머리엔 별다른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캐서린에 대한 생각뿐이다. 도무지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캐서린이라는 여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다.
전쟁으로부터 그는 벗어났다. 마치 컴컴한 어둠을 가로질러 호숫가 저편의 스위스로 탈출하듯이. 그는 삶의 어둠을 벗어난 것이다. 삶의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다소 뻔뻔스런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서머셋 모옴의 달과 육펜스의 스트릭랜드처럼,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조건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캐서린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도 결국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캐서린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지만, 그녀는 죽고 만다. 캐서린의 죽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는 그 현실을 직시한다.
프레디에게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시간의 속박으로 부터의 탈출에서 비롯된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프레디의 인식은 종종 비를 통해서, 혹은 비를 뚫고 나타난다. 존재와 현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서의 비. 프레디는 비를 뚫고 현실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비를 맞으며 현실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기도 한다. 차가운 강물 속을 빠른 속도로 떠내려 가면서 전쟁의 현실을 벗어나기도 하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어두운 호수를 건너 전쟁을 떠난다. 의미없는 어둠의 현실을 살게 했던 유일한 존재였던 캐서린의 죽음 조차 받아들이고 그 전날 묵었던 호텔로 걸어서 돌아가는 프레디의 머리위에도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다.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준엄하게 응시하며 걸어가는 시지프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볕처럼.
우리는 한계 속에 살다 무한 속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는 무한을 누리다 한계 속에 죽을 것이다
- 수평선, 최승호




 댓글 261개
| 엮인글 0개
댓글 261개
| 엮인글 0개
133개(4/7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책과 영화 | 하늘기차 | 5762 | 2005.09.02 16:36 |

|
채식주의자를 읽고(66번째 글쎄다... 그냥 꿈이야)
 |
하늘기차 | 5448 | 2012.04.10 16:45 |
| 71 |
|
한동우 | 1591 | 2009.11.09 20:32 |
| 70 |
|
한동우 | 1917 | 2009.10.19 18:10 |
| >> |
|
한동우 | 26823 | 2009.07.13 11:09 |
| 68 |
|
이은주 | 1068 | 2009.06.08 04:37 |
| 67 |
|
한동우 | 1124 | 2009.04.18 12:33 |
| 66 |
|
강기숙 | 931 | 2009.04.11 10:07 |
| 65 |
|
여행바람 | 1013 | 2009.04.01 12:33 |
| 64 |
|
강기숙 | 1215 | 2009.03.04 14:00 |
| 63 |
|
박영주 | 1682 | 2009.02.12 00:18 |
| 62 |
|
강기숙 | 1333 | 2009.01.31 22:45 |
| 61 |
|
강기숙 | 1142 | 2008.12.23 11:49 |
| 60 |
|
채현숙 | 1099 | 2008.12.02 18:00 |
| 59 |
|
하늘기차 | 1258 | 2008.11.05 13:51 |
| 58 |
|
마법사 | 1234 | 2008.10.24 14:09 |
| 57 |
|
박경장 | 1942 | 2008.10.14 01:31 |
| 56 |
  |
하늘기차 | 1081 | 2008.10.08 16:07 |
| 55 |
|
이은주 | 980 | 2008.10.05 20:38 |
| 54 |
|
한동우 | 999 | 2008.10.02 17:31 |
| 53 |
  [2] [2] |
하늘기차 | 958 | 2008.09.23 15:53 |
| 52 |
|
한동우 | 1122 | 2008.09.14 23: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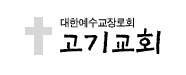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






